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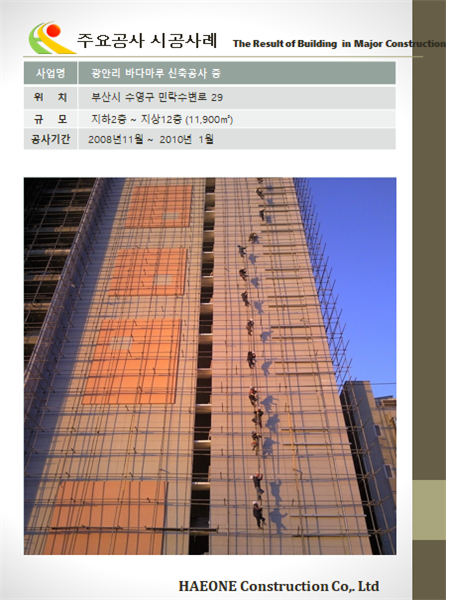

내가 사업에 종사한 지 벌써 강산이 세 번이나 바뀌었다.
미니 임신할 때부터였으니 꼬박 삼십 년이다.
흥하기도 했고 망하기도 했고 울고 웃으며 아이들 성장기까지 한마디로 굴곡진 인생이다.
처음 견적서 작성하면서 설레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세월은 이만큼 빠르다.
그때가 결혼하기 전 스물아홉이었으니 참 무상하기도 하지.
그 당시 내 나이 오십에는... 육십에는... 하고 설계한 적이 있었는데, 지금 막상 당면하고 보니 그 설계와는 전혀 다른 현실이 되어 있음에 씁쓸함이 든다.
내 휘하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거쳐갔고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한 직원도 아직 있다.
나를 도와준 원청회사들도 많았지만 나를 밀어내 내가 스스로 항복하고 떠나도록 한 경쟁업체도 부지기수.
그중 가장 힘들게 하였던 건, 내 녹을 받고 내 회사에서 뼈를 묻겠다던 직원이 등 뒤에서 허를 찌르며 땅따먹기를 하듯 야금야금 내 영역을 침범하는 그네들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수용해야 했던.
소금이 쉴까... 그렇다면 그건 소금이 아닌 거였다
소금이라고 철저하게 믿었건만.. 내 입맛이 변한 게 아니라 그건 애초부터 소금이 아니었다.
남의 것을 먹는 게 나쁜 놈들이라며 거기다 대고 누가 먹어도 먹었을 거다 따위로 얘기를 하는 이들에게 격분하며 부르르 떨던 나의 젊은 시절은 이제 아득한 추억거리다.
누가 먹어도 먹을 거라고 해서 남의 떡 훔쳐 먹어도 되는 건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르르이지만.
그러나 이제 와서 이런 소리가 다 무슨 소용인가. 아국 쏟고 발등 데는 꼴이지.
소경이 제 눈먼 거나 탓해야 한다고, 제 것 지키지 못한 게 바보지 안 그런가.
미니는 대학부터 분가했으니 새삼스러울 건 없었지만 주니가 작년 12월에 결국 독립했다.
어느 날 퇴근하여 집에 오니 주니 방에 양말 쪼가리 하나 없이 싹쓸이한 텅 빈 방에 아연해하며 펑펑 울었었다.
어쨌든 완전히, 오롯이 혼자된 올해.
이곳으로 보금자리를 다시 튼 날부터 계속 과거와 현실 속으로의 시간 여행이다.
좋은 점은 매일 아침 일출을 보며 눈뜨는 것과 집에서 가까운 학교 뒤편으로 산이 있어 한 시간씩 운동을 하려고 애쓴다는 점.
적갈색 융단처럼 깔려 있는 숲은 사람들이 다녀서 오솔길이 나 있는데, 채 썩지 않은 겨울 낙엽이 여기저기 쌓여 있어 그것조차 아름답다.
갈색 숲도 사랑하지만 막 싹이 피어나는 초봄의 연두 숲도 어여쁘고 빛을 따라 앞을 바라보니 붉은 석양이 산등성이에 걸려 있는 건 황홀한 축복이다.
여름이 코앞이라 아직 날이 밝지만 석양이 하루를 거두어가려고 금빛 그물을 펼치는 모습에 잠시 현실을 잊는다.
'현장일지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원리주택 (오우수 설비 전기 배관, 기초매트 타설) (0) | 2022.10.14 |
|---|---|
| 원리 주택(버림타설, 비닐 단열재 철근 배근) (0) | 2022.09.30 |
| 현장에서 (0) | 2020.07.28 |
| 변화 (0) | 2020.06.25 |
| 학장동 (0) | 2019.02.11 |